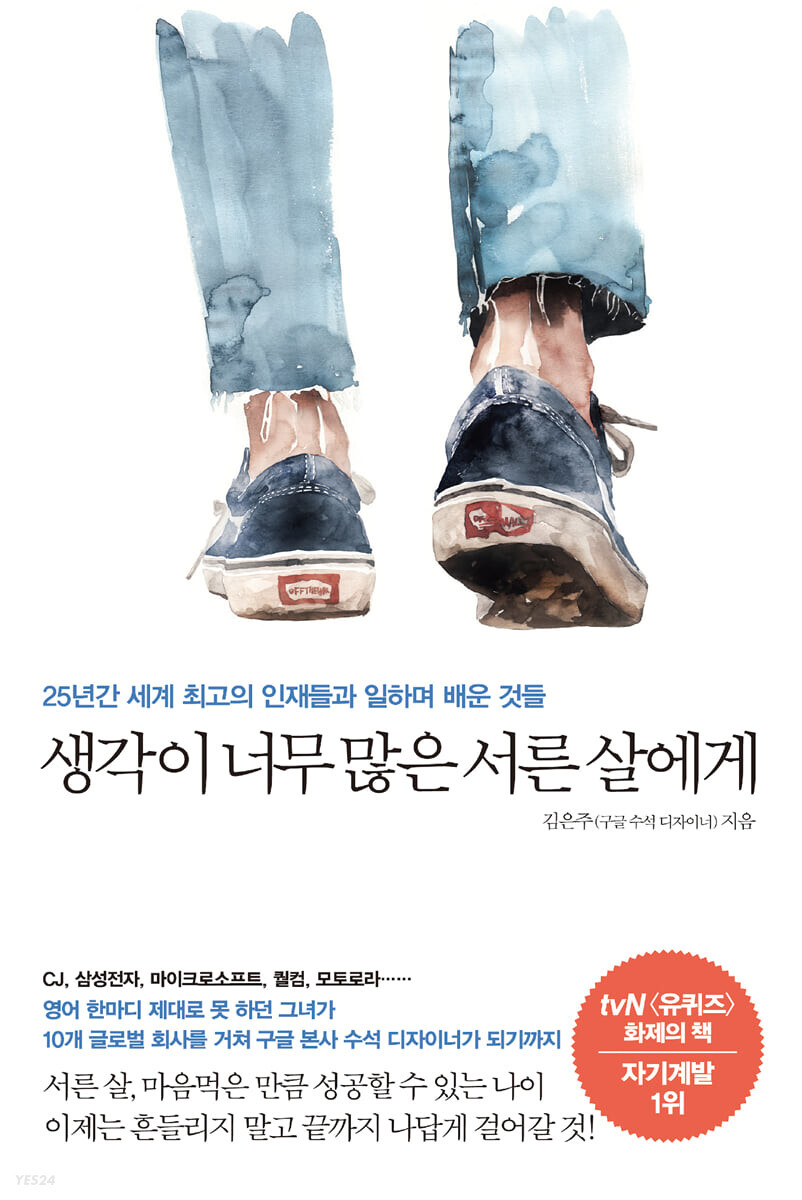
Chapter 6
5년 후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것들
매니저가 되어 보니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매니저는 독심술사가 아니다. 내가 회사나 상사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야 한다. 어떤 직원들은 승진 연차가 되면 매니저를 찾아와 자신을 어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많다.
매니저와 면담을 하고 승진을 요구하는 건 꼼수가 아니다. 얼마나 자신의 커리어에 진지하고 절박한가의 문제다. 성과를 내려면 성과가 나는 과제를 할당받는 게 중요하다. 매니저가 나 대신 일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성과를 낼 만한 과제를 할당해 줄 수는 있다. 무엇보다 승진이 아쉬운 건 나다. 매니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끙끙 앓지 말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자. 내 밥그릇은 소중하니까.
'모두 함께 배우고, 놀고, 만들자(Learn, Play, Build, Together)' 정신이 역동적인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 같이 동지가 되어 서로 실패담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신생 판, 정해지느 룰이 없고 발자국 없는 이런 땅이 나는 좋다. 노다지는 원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런 새로운 분야의 장점은 실패가 자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작은 발견이나 성공조차 다른 이들에게는 등불 같은 지표가 되기에 해당 분야에서 입지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콘퍼런스 발표자로 선정되면 이력서를 두고두고 빛낼 경력이 된다. 발표자로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 참여자와 다르게 네트워크 기회가 풍부하다. 또한 회사 내에서 전문성의 신뢰도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발표는 퀄리티가 핵심이 아니다. 발표를 했다는 그 행위가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킨다. 요즘 시대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지성이면 황천이다.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기자.
40년 넘게 가수로, 배우로, DJ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완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꾸준히 당신을 찾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찾아 다닌 거에요. 농담 같지만 진짜에요. 저를 누가 찾아요. 눈에 띄는 데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오랫동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이분도 그럴진대, 가만히 앉아서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는 건 그냥 망부석이 되겠다는 뜻이다.
재테크의 기본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다. 투자의 시드머니를 안전하게 모은다고 오랜 기간 은행 예금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하면 위험성이 커진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크게 좌절할 수 밖에 없다.
경력을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잡테크(Job Tech)도 마찬가지다.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투자한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했을 때 오는 상처와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내 시간과 노력을 과도하게 들이는 건 잘못된 투자다) 작은 일을 해 나가면, 그것들이 복리처럼 쌓여서 튼튼한 실력과 내공의 깊이를 만들어 낸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들 준비 자체는 다른 이들에게 전혀 상품 가치가 없다. 잡테크에서 상품 가치는 내 행적이 잡통장에 찍힐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준비가 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준비하는 거다. 순서를 헷갈리지 말자. 이것이 잡테크 제 1법칙이다.
나는 채용 담당자에게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기회가 있다면 이직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가 가진 물건에 자신이 있을 때는 우아하게 기선을 제압하는게 세일즈의 기술이다.
....
나는 내가 해 온 일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었고,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담당자는 신중하게 들은 뒤 나에게 구글에 지인이 더 있는지 물었다. 회사 내에 추천해 줄 사람이 많으면 합격 확률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직을 할 때 여러 곳에 동시에 합격하면 서로 경쟁이 붙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동시에 여러 군데에 지원하는 것은 항상 추천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예정에 없던 구글과 아마존 지원 과정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었다.
....
각 회사 채용 담당자와 전화 면접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면 면접 일정이 잡혔다. 나는 양쪽에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 주었다(서로 경쟁사면 프로세스 일정과 과정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된다).
....
면접을 하고 돌아오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장장 4개월 동안 진행된 채용 과정을 거치고 최종 대면 면접까지 마치자 옮겨야 겠다는 확신이 섰다. 구글은 모든 채용 과정이 위원회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회사다. 이때 속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경쟁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경쟁사로 가 버릴 거라는 일종의 긴장감을 주면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이 탐내는 물건은 나도 탐이 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협상에 유리한 칼자루를 쥐게 된다.
기말 과제가 끝난 후 교수님이 팀원들 평가를 하라며 평가서를 돌렸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문항이 있었다.
'당신이 기업 대표라면 A 를 채용하겠는가?'
'팀 프로젝트로 10만 달러를 벌었다면 멤버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겠는가?'
식은 땀이 흘렀다. 작업 내내 버벅대던 나를 과연 몇 명이나 채용하겠다고 할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금액 분배를 고민하다 보니 각 멤버의 기여도에 대해 더 실체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캠퍼스 방문 채용 행사에서 담당자와 면접을 본 후 나는 작은 포트폴리오 책자를 전해 주었다. 그 당시는 이미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 대부분 이력서에 포트폴리오 웹 주소를 적어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달랐다. 면접관은 여러 학생과 면접을 했을 텐데, 조금이라도 나를 더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가방을 챙기거나 짐을 풀다가 포트폴리오 책자가 눈에 띈다면 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지 않을까? 혹시 귀찮아서 책자를 버린다 한들 손해 볼 건 없는 일이었다. 나의 인생철학, '아님 말고'의 태도.
며칠 후 나는 채용 제안을 받았다. 합격이다!
'[한달어스] Handal.us > [한달독서] 21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Day 30] 지난 한 달은 당신에게 어떤 시간이었나요? (0) | 2022.07.05 |
|---|---|
| [Day 28]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게 - 08 (0) | 2022.07.03 |
| [Day 27]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게 - 07 (0) | 2022.07.02 |
| [Day 25] 요즘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자기계발은 무엇인가요? (0) | 2022.06.30 |
| [Day 24]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게 - 06 (0) | 2022.06.29 |




댓글